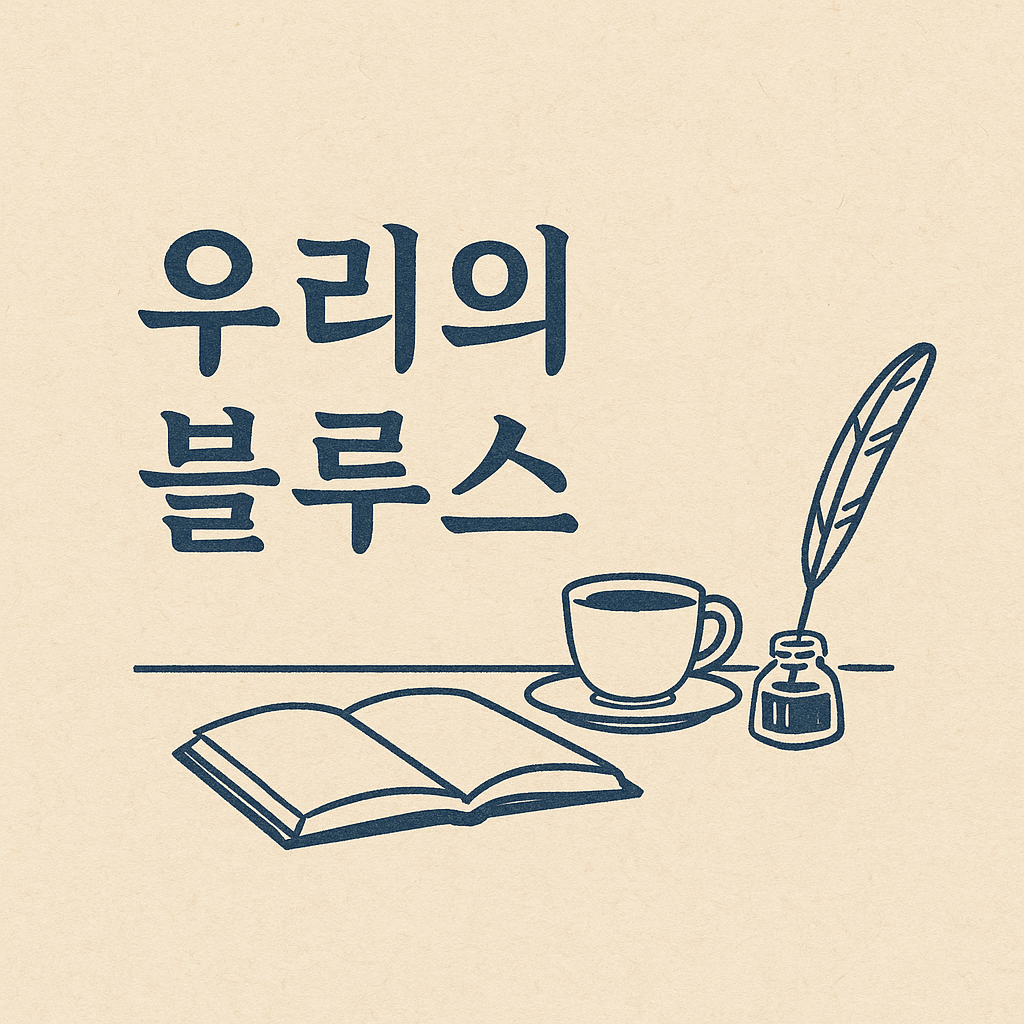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4편 – 우리는 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소모시키는가
모든 생각은 존중받아야 한다. 누군가의 정의는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함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조차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의 질문이다.
1. 정의의 얼굴이 지워지는 순간
그녀는 처음에 이름 없는 존재였다. 단지 SNS에 짧은 글을 남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글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녀는 ‘정의를 말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동시에 수많은 시선과 기대, 낙인과 논란 속으로 밀려들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한다. “공적 공간에서의 행동은 항상 노출을 수반한다.” 우리는 그녀에게 행동을 기대하면서도, 그 노출을 감당할 준비는 시켜주지 않았다.
2. 영웅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정의를 말하는 이는 종종 ‘영웅’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그 영웅은 지속되지 않는다. 뉴스에, 댓글에, 일상 대화에 소모되고, 어느 순간 ‘논란의 인물’이 된다. 칭송과 조롱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환된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를 ‘액체 근대’라고 표현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생성되고, 더 빠르게 잊힌다. 정의마저도 휘발성이다.
3. 왜 우리는 오래 지지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분노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대하지는 못한다. 왜일까? 그것은 피로, 무력감, 혹은 ‘나만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회피 때문이다. 정의를 말한 이는 혼자 남고, 우리는 그 곁을 조용히 떠난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연대 없는 정의는 위선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정의에 공감하는 척하지만, 그 뒤를 따르지는 않는다. 이 모순이 바로 ‘정의의 소비’를 만들어낸다.
4. 미디어, 팬덤, 그리고 잔혹한 애정
정의를 말한 인물이 미디어에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를 둘러싼 서사를 만든다. 그 서사는 때로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강요하고, 작은 실수 하나로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는 팬덤 구조와 유사하다. 지지와 애정은 있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기대와 통제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는 정의를 외친 이에게도 ‘완벽한 피해자’가 되길 요구한다.
5. 우리는 왜 상처를 반복하는가
누군가의 용기 있는 말이 상처로 돌아오는 구조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푸코는 권력이 말의 구조를 지배한다고 했다. 정의를 말할 때 그 구조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침묵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하는 이를 잃는다.
6. 지속 가능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거대한 외침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와 실천이어야 한다. 정의를 말하는 이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느리게 지지하고 더 오래 연대해야 한다. 조용한 응원, 작지만 단단한 지지가 필요하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말한다. “정의란,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 말하는 이의 불안, 외로움,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우리는 정의를 말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소모하고 있는가?
#해시태그
#정의를찾는소녀 #정의의소비 #정의란무엇인가 #한나아렌트 #지그문트바우만 #시몬드보부아르
#푸코 #마사누스바움 #시대정신 #연대의조건 #정치철학 #정의의지속성 #공적행동 #정의의영웅화
#팬덤사회 #완벽한피해자 #미디어비평 #소셜무브먼트 #정의의무게 #사회구조 #윤리적피로
#지속가능한정의 #일상의정의 #정의의반복 #말할수있는사회 #정의는태도다 #공감의철학
#정의와상상력 #정의의책임 #정의의공간 #우리의연대는지속가능한가
'먼지 많은 창고의 내용물 > 과학과 인문, 철학과 시사 그리고 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7편 – 다음 소녀는 누구인가? (2) | 2025.04.12 |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6편 – 기억되지 않은 정의는 정의인가 (2) | 2025.04.12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3편 – 촛불을 들었던 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0) | 2025.04.12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2편 – 침묵 이후의 공존 (0) | 2025.04.12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5편 – 정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 (0) | 202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