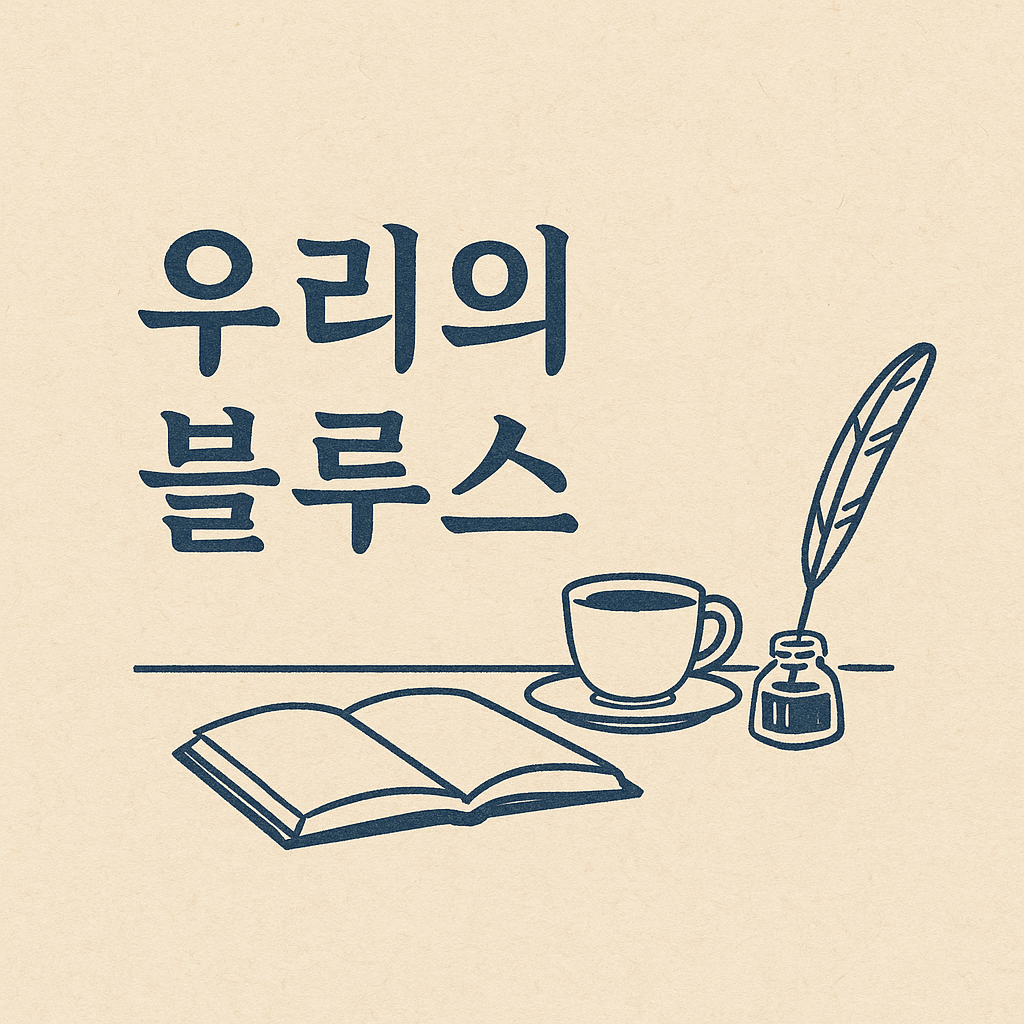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2편 – 침묵 이후의 공존
모든 생각은 존중받아야 한다. 서로 다른 믿음과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고 느낀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단어는 쉽게 오해되거나 분열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더 다르게 말해야 할까?
1. 침묵의 시대, 말하는 자의 책임
우리는 지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한다. “말하는 자는 곧 권력의 위치에 선다.” 자유롭게 말하되,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인가. SNS는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무수한 혐오와 왜곡을 쏟아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때론 방관이 되며, 말은 때로 책임이 아닌 공격으로 작동된다. 우리는 그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다.
2. 정의는 늘 옳은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의는 본래 공존과 질서를 위한 개념이었지만, 어느새 도구가 되어 타인을 향한 무기로 쓰이기도 한다. 철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정의의 생각』에서 “완전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정의"라고 강조한다.
완전한 정의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관점과 고통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한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
3. 광장의 외침, 사적 공간의 외로움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외쳤다. 그러나 그 후, 돌아간 방 안에서 느낀 외로움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공동체의 정의와 개인의 외로움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한다.
정의는 연대에서 가능하지만, 그 연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다룰 때에야 진짜 힘을 갖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개인의 고독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열린다.
4. 정의의 피로, 연대의 고갈
우리는 너무 많은 정의에 노출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미얀마의 탄압, 국내의 성폭력 사건, 난민의 절망. 정의는 넘쳐나고, 그만큼 피로도 쌓인다.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도덕적 피로는 연대의 적"이라 말했다. 끊임없는 분노와 슬픔은 결국 무감각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대’다. 소리 지르는 대신 손을 잡을 수 있는 방식.
5.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종종 "왜 너는 그걸 말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철학자 칼 포퍼는 “관용은 불관용에 대해서도 관용일 수 없다”고 말한다. 즉,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복잡하고 모순된 세계 속에서 늘 질문을 품어야 한다.
6. 정의는 결국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
정의는 원칙 이전에 감정이다. 아픔에 대한 공감, 다름에 대한 수용, 이야기의 경청.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정의란 타인의 고통에 감응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정의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법이 아니라 태도이다.
7. 침묵을 넘어, 다르게 말하기
우리는 정의를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함이 아니라 시선으로, 분노가 아니라 경청으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언어와 태도에서 시작된다.
공존을 위한 정의는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정의를 살고 있는가?
#해시태그
#정의를찾는소녀 #침묵의사회 #정의란무엇인가 #공존의정의 #시대정신 #철학에세이 #푸코 #아마르티아센
#지그문트바우만 #마사누스바움 #칼포퍼 #정의의피로 #연대의조건 #정의의이중성 #정치철학 #공감의윤리 #경청의태도
#현대철학 #정의의진화 #소셜무브먼트 #시민의목소리 #다르게말하기 #윤리적피로 #말의책임 #정의의실천 #정치참여 #관용의철학
#정의는감정이다 #고통에대한공감 #진짜정의는경청에서 #타인의고통 #침묵을넘어서 #정의는태도이다
'먼지 많은 창고의 내용물 > 과학과 인문, 철학과 시사 그리고 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4편 – 우리는 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소모시키는가 (0) | 2025.04.12 |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3편 – 촛불을 들었던 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0) | 2025.04.12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5편 – 정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 (0) | 2025.04.12 |
| 정보의 비대칭성 법칙: 거래는 왜 불공정해지는가? (1) | 2025.04.12 |
| 피구세의 법칙: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조세의 힘 (0) | 202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