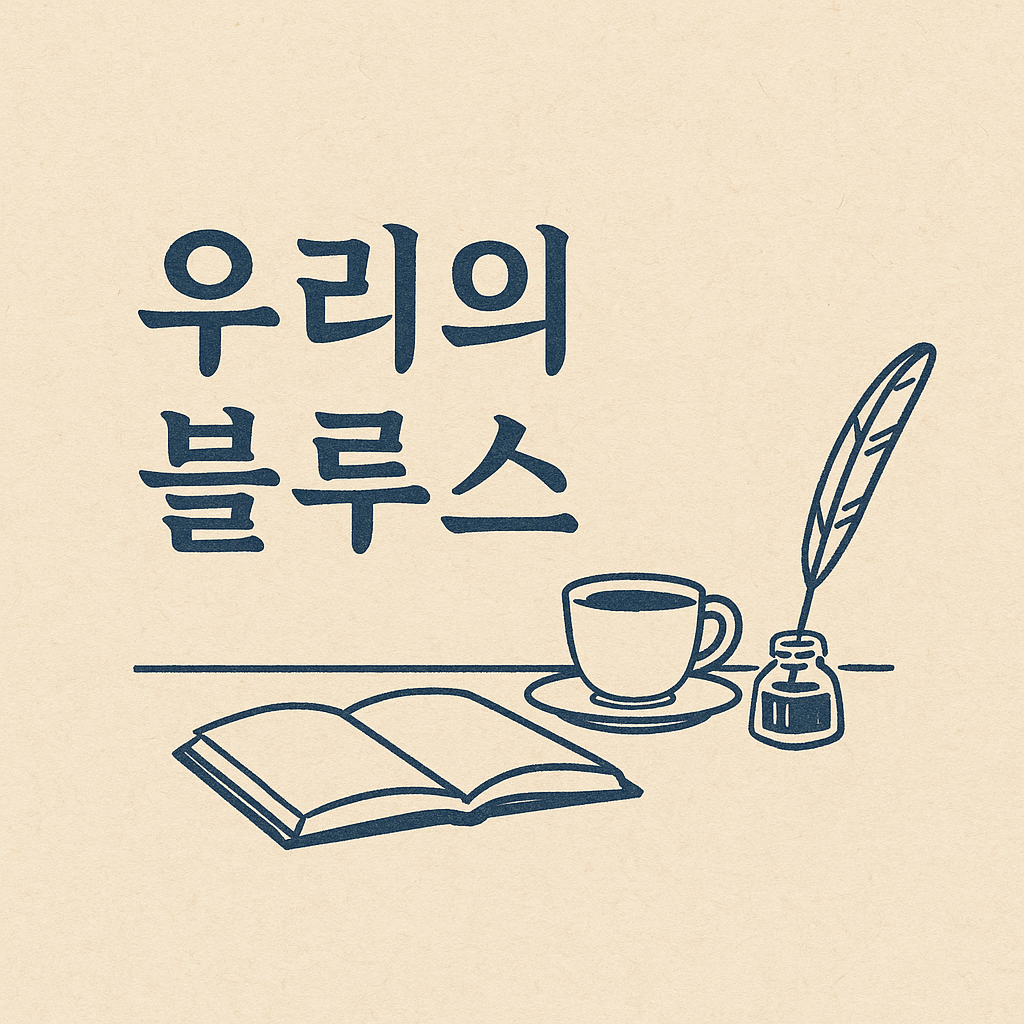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3편 – 촛불을 들었던 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든 생각은 존중받아야 한다. 정의에 대한 기억은 개인마다 다르며, 그 기억은 각자의 고통과 희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1. 광장의 불빛은 어디로 갔는가
2016년 겨울, 우리는 함께 거리로 나갔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침묵 대신 외침을 선택했다. '정의', '상식', '국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삶의 방향이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10년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2. 세대는 나이로 구분되지 않는다
촛불을 들었던 세대는 청년만이 아니었다. 유모차를 밀고 온 부모, 할머니의 손을 잡은 중학생, 퇴근 후 도시락을 들고 온 직장인. 정의를 바란 이는 단일한 계층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감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장은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정치가 성숙하는 공간”이라 했다. 그날의 광장은 단지 저항의 장소가 아니라, ‘시민됨’을 실현하는 거대한 실험장이었다.
3. 기억은 행동이 될 수 있는가
기억은 소중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퇴색된다. '촛불세대'라는 이름은 영광인가, 아니면 미완의 과제인가? 우리는 이제 투표소보다는 생계 앞에서, 정치 뉴스보다는 주식 앱 속에서 살아간다.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사회의 구조는 개인의 무의식 속에 침투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주 체념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상은 현실의 무게에 눌리고, ‘정의’는 체념과 현실 사이의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다.
4. 민주주의는 끝났는가, 혹은 지루해졌는가
한때 광장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조차 이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며 고개를 돌린다. 참여의 열정은 식은 걸까, 아니면 무력함에 지친 걸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괴물을 오래 응시하면, 그 괴물이 우리를 응시하게 된다.”
우리는 변화를 요구했지만, 변화 이후의 피로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 피로는 ‘정치혐오’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감싼다.
5. 우리가 잃어버린 말들
‘공공성’, ‘책임’, ‘상식’… 그날의 구호는 어디로 갔을까. 언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무력해졌다.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 일상의 정치, 곧 말하기와 경청, 토론과 설득의 자세를 되살려야 한다.
하버마스가 말했듯, “민주주의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날의 촛불은 이벤트가 아닌 시작이어야 했다.
6. 정의의 세대는 다시 올 수 있을까
‘정의를 찾는 소녀’는 단지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그날 광장을 메운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다. 우리는 다시, 정치를 일상의 말로 끌어내야 한다. 정의는 투쟁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한다.
다시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왜 거리로 나갔는가. 그리고 지금은 왜 다시 돌아가지 않는가.
정의의 기억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가?
#해시태그
#정의를찾는소녀 #촛불세대 #광화문집회 #정의란무엇인가 #공론장 #하버마스 #피에르부르디외 #니체
#시대정신 #정치참여 #기억의정치 #촛불혁명 #민주주의는지루한가 #정치혐오 #일상의정치 #시민됨
#사회구조 #이성적토론 #철학에세이 #사회비평 #정의의기억 #정치피로 #정의의습관 #경청과설득 #언어의힘
#공공성회복 #상식의힘 #잃어버린말들 #다시민주주의 #정치의일상화 #촛불은계속된다
'먼지 많은 창고의 내용물 > 과학과 인문, 철학과 시사 그리고 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6편 – 기억되지 않은 정의는 정의인가 (2) | 2025.04.12 |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4편 – 우리는 왜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소모시키는가 (0) | 2025.04.12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2편 – 침묵 이후의 공존 (0) | 2025.04.12 |
| 정의를 찾는 소녀: 시리즈 5편 – 정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 (0) | 2025.04.12 |
| 정보의 비대칭성 법칙: 거래는 왜 불공정해지는가? (1) | 202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