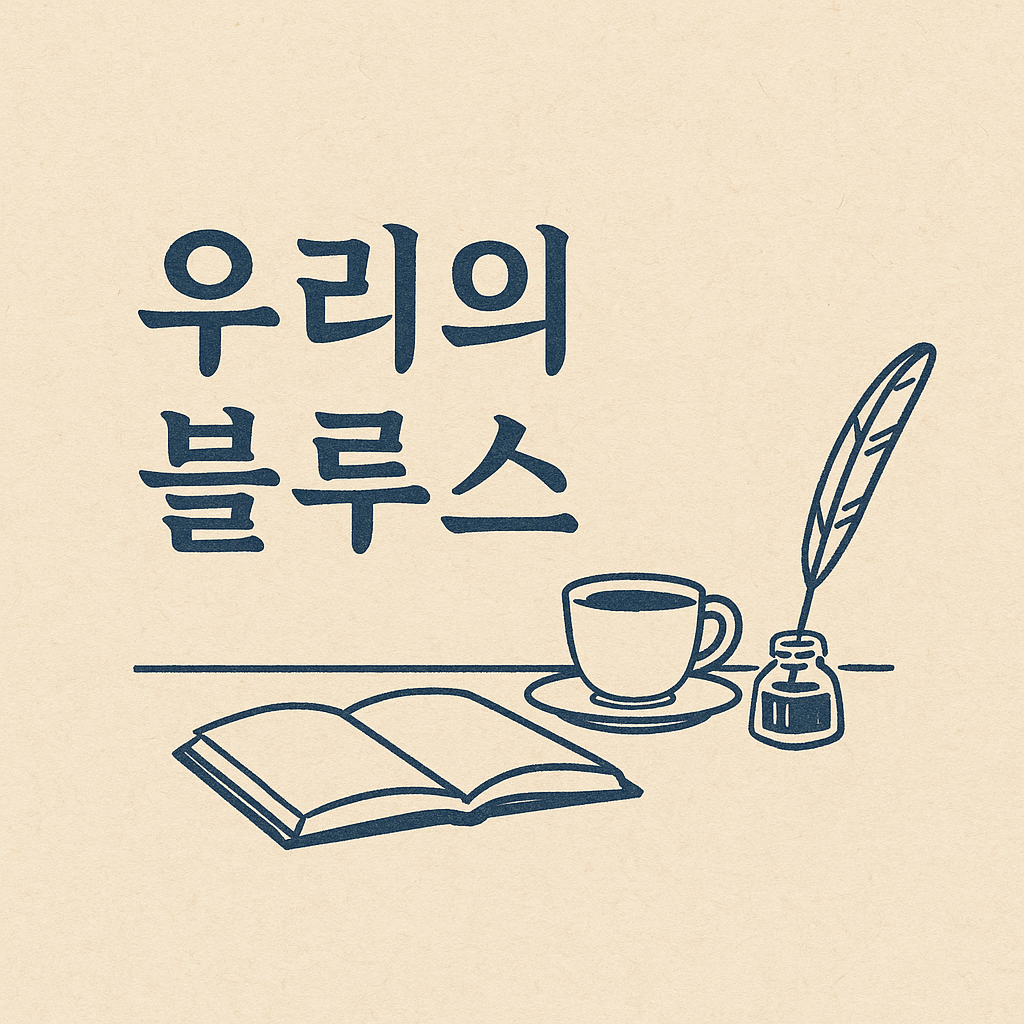1. 생사의 경계에서 살아온 의사
이국종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의사’라는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앞장선 ‘현장주의자’였다.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외과 교수로,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다.
그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사건이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총상을 입은 환자를 이송받은 그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을 집도하며 생명을 지켰다. 이 사건은 단지 한 환자의 회복을 넘어, 한국 외상 시스템의 문제와 가능성을 동시에 세상에 드러낸 장면이었다.
2. 시스템보다 앞서 뛰는 한 사람
이국종 교수는 수술실에서만 머무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이 언론과 정치권, 국민 앞에 나서 외쳤다. “우리나라엔 시스템이 없다”고. 중증외상센터의 부족, 의료진의 인력난, 응급헬기 이착륙 문제 등 그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실명을 거론해가며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특히 ‘골든아워’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시간 안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가 보여준 건 ‘희생’이 아니라, ‘정당한 분노’였다. 그는 늘 말한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시스템이 없으니 내가 더 나서야 했던 것뿐이다.”
3. 닥터헬기와의 싸움, 하늘을 여는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닥터헬기’ 도입과 전국 운영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일이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시간, 이동 수단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그의 외침은 결국 정치권을 움직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언론 캠페인, 국회 청문회까지 거치며 닥터헬기는 전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가 단순히 헬기를 띄우는 게 목표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항공 의료 네트워크를 꿈꿨다. 각 지역 거점병원, 응급 대응팀, 항공 이착륙장,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까지. 그는 의사이기 이전에 사회 설계자였다.
4. 피로의 정점에서 사라진 사람
2020년,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학교병원을 떠났다. 병원 내부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 그리고 지속적인 건강 악화로 인해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고, 일부는 왜 그는 ‘싸우다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는 여전히 묵묵히 다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그는 국군대전병원 원장으로 부임해, 군 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이끌고 있다. 군 장병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그는 또 다른 골든아워를 만들어내고 있다.
5. 숫자와 생명 사이, 윤리의 길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현실에서는 고통과 불합리로 돌아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철회하지 않았다. 의료라는 영역은 통계와 효율을 따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국종은 늘 물었다. “과연 그 수치가 사람의 온기를 담고 있는가?”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환자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다.” 이 문장은 모든 병원에서 울려 퍼져야 할 진리이기도 하다.
6. 마무리하며 – 진짜 ‘국가’란 무엇인가
이국종 교수는 어느 자리에서도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맨몸으로라도 막아야 했던 사람.” 그는 ‘국가’라는 말이 단지 국방과 정치에만 있지 않다고 믿는다.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그는 말한다.
나는 이 글을 마치며 질문 하나를 남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 어떤 손을 내밀고 있는가?” 이국종 교수는 그 손이 되어 살아온 사람이다.
해시태그
#이국종 #중증외상 #골든아워 #닥터헬기 #국군대전병원 #의료개혁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응급의료시스템 #생명의현장
'먼지 많은 창고의 내용물 > 과학과 인문, 철학과 시사 그리고 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 확인 필수 (3) | 2025.04.21 |
|---|---|
| 2025년 5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시행 – 얼마나 오르나? (1) | 2025.04.21 |
| 경계에서 말하다 – 언론과 정치, 그 사이의 여정 (2) | 2025.04.15 |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 주요 일간지의 신뢰도와 특징 비교 (2) | 2025.04.13 |
| JTBC, TV조선, MBN, 채널A — 종편 4사의 신뢰도와 특징 비교 (2) | 202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