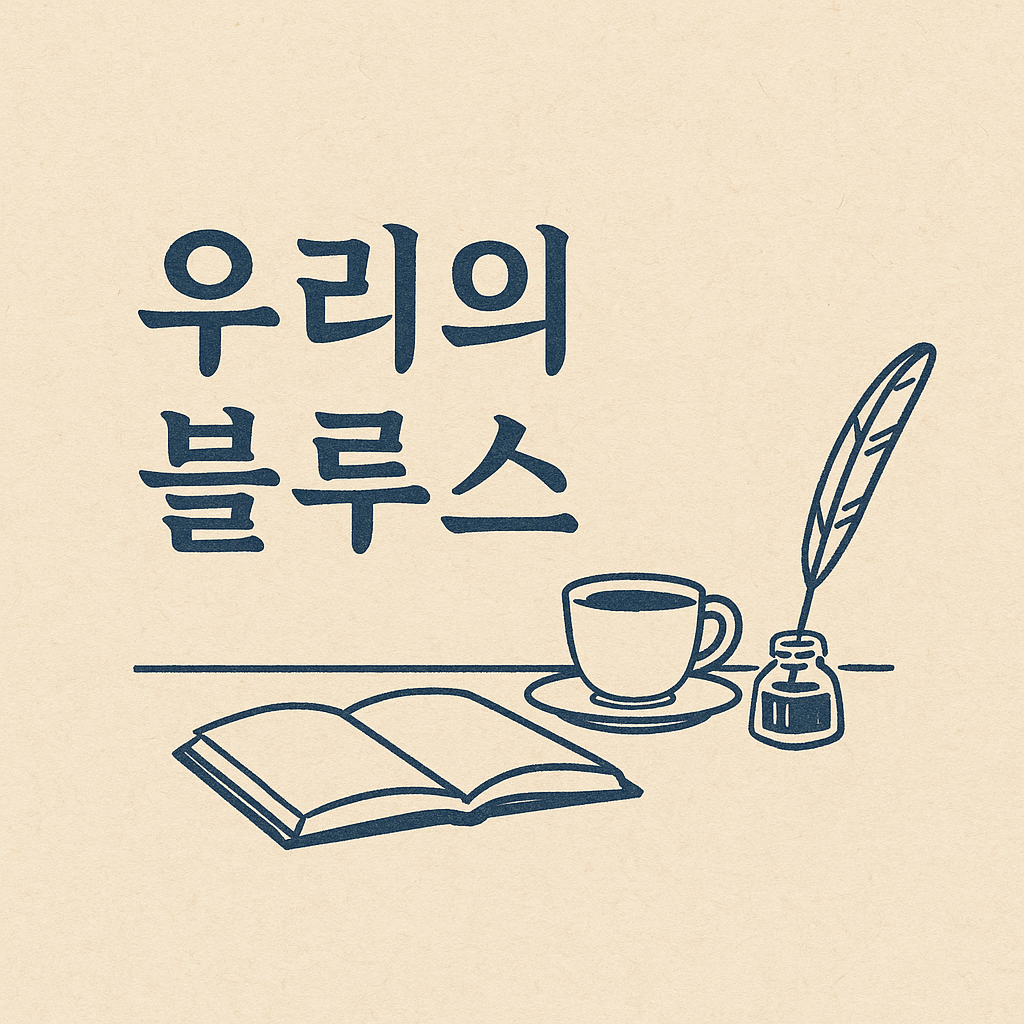페데리코 펠리니의 :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들의 쓸쓸한 초상
1953년, 이탈리아 영화의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는 자신의 고향 리미니를 배경으로 한 작품 I Vitelloni (비텔로니)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영화는 단순한 청춘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성장과 미성숙, 욕망과 좌절, 우정과 고독의 교차점에 서 있는 다섯 남자의 초상이자, 페데리코 펠리니 자신의 청춘에 대한 회고록이다. 영화는 그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보편적 슬픔과 삶의 아이러니가 스며들어 있다.
“비텔로니”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송아지'를 뜻하지만, 이탈리아 방언에서는 직업도 없이 고향 마을에서 빈둥대며 시간을 보내는 게으른 젊은이들을 의미한다. 영화의 다섯 주인공—파우스토(Fausto), 모랄도(Moraldo), 레오폴도(Leopoldo), 알베르토(Alberto), 리카르도(Riccardo)—는 모두 고향을 떠나지 못한 채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인물들이다.
1. 미성숙한 남자들의 초상
영화의 중심에는 파우스토가 있다. 그는 철부지 바람둥이로, 마을 미인 산드라(Sandra)를 임신시켜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그는 바람둥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한다. 파우스토의 모습은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의 욕망과 무책임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연민과 슬픔이 깃들어 있다.
모랄도는 영화의 화자이자, 펠리니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다. 그는 다섯 친구 중 유일하게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영화의 마지막, 기차역 플랫폼에서 고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련, 슬픔, 희망이 뒤섞여 있다. 모랄도의 떠남은 영화 속 작은 희망의 불빛이자, 동시에 성장의 아픈 통과의례다.
2. 마을이라는 무대
영화의 배경인 작은 해안 도시—실제로는 펠리니의 고향 리미니—는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영화는 도시의 광장, 바닷가, 극장, 거리, 축제 현장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삶을 풍경처럼 펼쳐낸다. 마을은 다섯 친구를 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가두는 공간이다. 마을은 안온함과 구속, 향수와 권태가 공존하는 무대다.
이 마을 안에서 다섯 친구는 일탈을 꿈꾸고, 사랑을 갈구하고, 실패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온다. 떠나지 못한 자들의 표정에는 체념과 무기력, 그러나 어딘지 모를 따뜻함이 깃들어 있다. 펠리니는 그 따뜻한 시선을 통해 이들의 나약함과 한계를 연민하며 바라본다.
3. 웃음과 슬픔의 경계
는 끊임없이 웃음을 유발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친구들의 철없는 장난, 바람둥이 짓, 허세 가득한 연극… 이 모든 장면은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허와 슬픔이 숨어 있다. 펠리니는 삶의 아이러니를 '코미디와 비극의 이중주'로 그려낸다.
특히 알베르토가 축제 밤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바라보며 무너져 우는 장면은 영화의 감정적 절정이다. 그는 가족의 무거운 현실,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떠나지 못한 자의 슬픔을 동시에 체감한다. 그 눈물은 웃음 뒤에 찾아온 불현듯한 삶의 실감이다.
4. 남성성과 성숙의 아이러니
영화는 '남성성'과 '성숙'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다섯 친구는 스스로를 '남자'로 자임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른이 아닌 아이에 가깝다. 책임감 없는 사랑, 허세 가득한 연극, 말뿐인 포부… 그들은 '남성적 권위'의 옷을 입으려 하지만, 그 옷은 그들에게 너무 크다.
모랄도의 떠남은 그 '남성성의 연극'에서 벗어나는 상징이다. 그는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지하고, 성장을 위해 떠난다. 그러나 영화는 그 떠남조차 완전한 해방이나 성취로 그리지 않는다. 떠난다는 것은 '상실'을 동반하고, 남는다는 것은 '체념'을 동반한다. 영화는 그 둘 사이의 아이러니를 고요하게 응시한다.
5. 페데리코 펠리니의 자전적 색채
는 펠리니의 자전적 영화다. 그는 자신의 청춘, 고향, 친구들, 젊은 시절의 방황을 영화에 담았다. 영화 속 다섯 친구는 모두 펠리니 자신이거나, 그가 알고 있던 실제 인물들이다. 그렇기에 영화는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이며, 환상적이다.
펠리니는 개인적 기억을 통해 보편적 감정을 끌어낸다.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표류는 이탈리아 사회의 한 단면을 담고 있으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이야기다.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고, 떠났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모순적 감정이 영화 전편을 관통한다.
6. 오늘날 를 본다는 것
오늘날 이 영화를 본다는 것은 '청춘의 초상'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한때 비텔로니였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무력함과 허세를 오가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련을 남기는 시간. 영화는 관객 각자의 청춘을 떠올리게 한다.
영화는 관객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모랄도는 떠났는가?” “당신은 아직 비텔로니로 남아 있는가?” 이 영화는 그 질문에 정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 질문을 남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오래 마음에 머문다.
7. 결론: 나약함을 품은 인간에 대한 연민
는 청춘의 초상이자, 나약함의 초상이다. 펠리니는 나약한 인간들을 조롱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의 허세와 실패, 철없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 연민은 웃음을 부르고, 그 웃음은 슬픔을 동반한다.
영화는 끝나도, 모랄도의 마지막 시선, 알베르토의 눈물, 파우스토의 표정은 관객의 마음에 남는다. 그 얼굴들은 우리 자신의 얼굴이다. 이 영화는 그렇게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미성숙함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한 편의 시다.
#비텔로니 #IVitelloni #페데리코펠리니 #이탈리아영화 #영화명작 #영화평론 #영화리뷰 #영화추천 #클래식영화 #영화분석 #청춘영화 #성장영화 #인생영화 #예술영화 #감동영화
'영화의 모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페데리코 펠리니의 <8½>: 창작과 존재의 미궁에 대한 자전적 서사 (24) | 2025.05.02 |
|---|---|
| 페데리코 펠리니의 : 허무와 쾌락의 황홀한 밤 (3) | 2025.05.02 |
| 루키노 비스콘티의 : 가족, 사랑, 폭력의 서사시 (1) | 2025.05.02 |
| 마이클 래드포드의 : 시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성장에 대한 우아한 비유 (1) | 2025.05.02 |
| 비토리오 데 시카의 : 인간 존엄과 고독의 절제된 노래 (3) | 2025.05.02 |